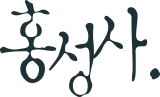쿰 352호
[살며 사랑하며] 조영수(쿰회원)
–
제주의 계절
–
올해로 제주살이 6년차에 접어든다. 처음 입도하던 날, 우리는 여섯 살 된 딸아이와 백일도 채 되지 않은 아들을 안고 낯선 땅, 제주로 들어왔다. 안정된 보금자리를 부지런히 꾸리는 동안 시간은 흘러 아이들은 어느새 함께 달리고, 먹고, 헤엄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 또한 함께 제주의 사계절을 즐기는 법을 하나하나 익혀 왔다.
제주 온 지면에 형광등을 밝게 켠 듯 노란 유채꽃이 피어나는 봄이 되면 고사리를 꺾고 조개를 캔다. 제주 고사리는 일정한 밭에서 재배하는 채소가 아니다. 한라산 들녘이나 나지막한 언덕, 오름, 목장 등지에 바람결에 실려 온 고사리 포자가 떨어진 곳에서 우후죽순으로 자란다. 고사리를 꺾어 와 삶고 따스한 봄볕에 말려 1년 동안 먹을 것을 저장해 두기도 하고, 육지에 있는 친지들에게 보내기도 한다. 바닷가로 나가면 아직 물이 차서 수영을 하지는 못하지만 날이 더 더워져서 비브리오균의 위험이 커지기 전에 조개를 캔다. 캐온 조개는 해감시켜 냉동실에 보관해 두고 먹는다. 당일에는 물론 신선한 조개로 끓인 시원한 조개탕을 먹을 수 있다.
여름은 진정 아이들의 계절이다. 6월이 되면서 시작되는 태풍과 장마의 때를 비켜 가며 서서히 해수욕을 시작한다. 아이들이 좀더 큰 올해 여름부터는 함께 스노클링을 했다. 제주 바다는 맑고 깨끗한 편이라 수심이 얕은 곳에서도 물고기들이 많이 보인다. 바닷속에서 비행하듯 재빠르게 유영하는 물고기를 따라 여행하다 보면 바닷속은 창조주의 거대한 수족관임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무한한 창조성과 질서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운행하고 계심을 생각한다.
가을에는 문어를 잡는다. 추석을 전후로 문어가 제주 연안가의 돌 틈에서 많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올해는 추석 일주일 전에 한 해의 마지막 해수욕을 하러 갔다가 얼떨결에 문어를 네 마리 잡고 돌아왔다. 제주의 가을은 오름의 계절이다. 제주 온 지면을 덮으며 피어나는 억새는 밝은 햇살 아래에서는 은빛으로, 저녁노을이 질 때는 금빛으로 일렁인다. 오름 정상에서 푸르게 펼쳐진 들판과 제주의 자연을 보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분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펼쳐져 있고, 그 속에 인간을 두신 분은 우리를 분명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든다. 뺨에 와닿는 세찬 바람은 영혼을 사랑하되 힘차게 사랑하신다는 외침 같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유독 흐린 날이 많지만 아이들에게 겨울이 즐거운 것은 눈이 온 다음 날 한라산에 펼쳐진 수십 미터의 자연 눈썰매장 때문이다. 눈썰매를 즐기는 아이들이 눈 덮인 한라산 중턱을 즐겁게 뛰어오르는 광경을 볼 수 있다. 또한 감귤이 가장 풍성할 때여서 어디서든 귤이 넘쳐난다. 이웃의 밭에 가서 감귤 따는 것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곳저곳에서 나눔받아 세 끼 식사만큼 자주 먹고 또 많이 먹는 것이 이때의 귤이다.
아이들과 함께 계절의 변화를 보며, 놀멍 쉬멍 지내다 보니 어느새 6년의 시간이 흘렀다. 낯선 땅에 정착할 결심을 하기까지 그 바탕에는 인생 중에 만날 수 있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그럴 때, 삶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자연’, ‘책’ 세 단어는 나의 영혼을 가장 본질적인 것 앞에 서게 만들었다. 영혼이 이 세 단어를 지향하는 순간, 가장 가난하면서도 정결한 고백으로 생의 의지를 다져 왔다. 그러나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게 ‘자연’과 ‘책’은 다시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단어를 따른다. 나의 영혼의 여정에 제주의 자연과 책은 삶의 큰 버팀목이 된다. 그러함에 쿰회원으로 묶여 작지만 유의미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 진정 감사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