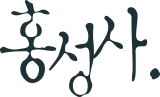쿰 368호
{서평} 홍종락 《성령을 아는 지식》 역자, C. S. 루이스 전문 번역가
–
19년 만의 재회
–
그때는 모든 것이 새로웠다. 출판사 방문, 편집장과의 만남, 샘플 원고
수령, 번역 계약서 작성, 번역이 ‘독자의 시점에서’ 진행해야 할
작업임을 알려 준 편집자와의 협업까지 전부 처음이었다.
《성령을 아는 지식》은 번역의 수고로움과 즐거움을 동시에 알려 준
첫 번역서다. 이 책을 번역하고 나는 전업 번역가로 나서기로 마음먹었다.
당시가 인생의 전환기였던 터라 번역은 여러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볼링장 옆 사무실, 휴대폰 판매 매대, 비행기 안, 파리의 호텔,
나이지리아의 숙소, 집, 도서관.
이 책의 개정판 서평을 요청받고 먼 기억 속 책을 다시 읽을 좋은
기회다 싶어 흔쾌히 승낙했다. 긴 세월을 생각하면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나도 이상할 것이 없을 듯한데, 기억에 남는 대목이 여럿 있었고
그 중 일부는 번역했던 장소와 그때의 분위기까지 떠올랐다.
그만큼 그때는 번역이 신선하고 자극적인 일이었던가 보다.
읽어 보면 느끼시겠지만, 이 책은 ‘의외로’ 잘 읽힌다. 잘 잡히지 않는
‘성령’을 주제로 한 신학 서적이 분명한데, 알아듣지 못할 말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성경과 신학에 해박한 저자가 자신이 잘 소화한
주제를 독자에게 쉽고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그 노력이
성공하면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의 결정체 같은 느낌이랄까. 중간 중간
등장하는 영화, 시, 재즈, 팝송, 경험담은 글에 생생함과 때로는
‘낭만성’까지 더해 준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그 어떤 성령의 능력이든
은사든 그 진위와 가치를 판단할 때는 그리스도가 조명 받고
드러나고 높임을 받는가, 그로 인해 그리스도를 닮는 열매가
드러나는가를 기억해야 함을 저자는 거듭 강조한다.
그것을 전제로 저자는 성령에 대한 논의를 ‘성결’, ‘은사’, ‘부흥’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엮어 낸다. ‘성결’(거룩)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가게 만드시는 일”(136쪽)이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의지하는 성결은 불경건한 성결일 뿐”(136쪽)이다.
성결에 대한 논의(3, 4장)에서 저자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내세우는 케직교의, 웨슬리주의에 대항하여 어거스틴주의를 내세운다.
어거스틴주의적 거룩함을 ‘열심히 일하는 거룩함’이라 부르며
소개하는 ‘활동의 네 단계’(178쪽)는 두고두고 행동의 지침으로 삼을
만하다.
5, 6장에서는 은사회복운동의 가치와 한계를 잘 드러낸다.
“하나님이 많은 세계교회를 서서히 좀먹고 있는 일종의 중풍과도 같은
숨 막히는 지성주의와 메마른 형식주의, 신학적 회의주의를
교정하는 수단으로 그 흥겹고 소박한 신앙과 전염성 있는 따스한
사랑을 보내셨다”(347쪽)는 평가는 은사회복운동에 대한 패커의
기본 입장을 잘 보여 준다. 그러나 은사회복운동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정말 필요한 것은 ‘부흥’이라고 역설한다.
그리고 7장에서 그 논의는 부흥에 대한 개괄적 설명과 부흥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진다. 은사회복운동을 기독교 역사에 적절히 자리매김하고,
다시 이를 부흥과 연계시켜 여러 파편적인 논의와 관심을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엮어 내는 것은 이 책의 미덕이 아닌가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더욱 닮아 가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그들의 신학에 결함이 있더라도 괘념치 않고 응답하신다”(230쪽).
하지만 우리의 편견과 그릇된 관심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왜곡할 수
있기에 올바른 신학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자는 여러 가지 주장들의
장단점을 동시에 지적하여 균형을 잡게 해준다. 여기서의 균형은 기계적
중립이 아니다. 저자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그에 의거해
다른 입장의 공과를 살핀다. 확신 있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서도 다른
입장을 제대로 다루고자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여유와 신사적이고
따뜻한 태도를 잃지 않는 그의 스타일도 눈여겨볼 만하다.
성령을 더욱 깊고 뜨겁게 알고 그분과 ‘동행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의
내용과 형식 모두를 통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이런 책을
첫 번째 번역서로 만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분한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