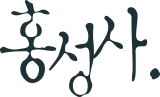쿰 360호
{저자의 일상} 오근재 《인문학으로 기독교 이미지 읽기》 저자, 전 홍익대 교수
–
콘스텔라치온
–
발터 벤야민이 말한 ‘별자리(konstellation)’는 1940년에 쓴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의 관련 노트들을 꼼꼼하게 읽어
보지 않으면 그의 에세이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을 만큼 구석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생각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란 시간의 띠 위에서 끊어짐 없이 연속되어
유토피아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변증법적인 이미지에 대한 구성적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를 설명하려는 하나의 보기로 그는 ‘별자리’라는 보기를
들었습니다.
성좌는 한마디로 우주 속에 운행하는 별들을 지구촌인의 눈으로 본
그림입니다. 물병자리, 황소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작은곰자리, 큰곰자리,
카시오피아, 안드로메다 등, 수없이 많은 별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북두칠성은 큰곰자리에 있으며, 국자 모양의 끝부분 두 별의 길이를
5배 연장하면 바로 그 자리에 북극성(Polaris)이 있습니다. 북극성도 일곱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작은곰자리에 해당하는 하나의 별점입니다.
그런데 별자리를 만들면서 명멸하고 있는 별들은 지구와 동일 거리에 있는
천구상의 별점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북두칠성의 국자 손잡이의 시작 부분에
있는 별은 지구로부터 대략 200광년, 두 번째는 88광년, 세 번째는 68광년,
… 그리고 국을 퍼내는 국자의 끝부분에 있는 별과 지구까지의 거리는 약
100광년에 이릅니다. 그리고 작은곰자리의 꼬리 끝부분에 있는 소위 북극성은
지구로부터 약 400광년에 걸친 엄청난 거리의 초거성입니다. 말하자면
밤하늘에서 우리가 보는 큰곰과 작은곰을 이루고 있는 그림은 짧게는
지금으로부터 68광년 전에, 그리고 먼 별은 400광년 전에 그 별에서 출발했던
빛으로 이루어진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것은 한국전쟁 발발 시점, 멀게는
조선조 광해군 재임 시점에서 출발한 빛이 지금 지구에 던지우고 있는 그림을
우리가 보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 별들은 지구인들의 의식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의적이며 무작위하게
발광하고 있는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의 집합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지구인들은
천공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스토리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개인적인 운명을 비끄러맵니다. 이것이 소위 ‘별자리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별처럼 수많은 사물들이 있고 시간의 띠 위에서 명멸했던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각각 시점(時點)을 달리하고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사건과 사물들 중, 일부를 선택해서 별자리와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에 떠 있는 수천억 개의 별들
중에서 특정한 일부를 묶어 별자리를 만들었던 방식과 동일하게 말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썼던 《인문학으로 기독교 이미지 읽기》란 책도 결국 일부
인문학적 별들과 기독교 이미지라는 별들을 묶어 별자리를 그리[畵]고, 그에
대한 스토리를 부여했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어의 법칙에 꿰맞추는
과정에서 그 별자리 이야기의 풍성함은 소멸의 과정을 겪으면서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뼈다귀’를 좋아했던 일부 독자들의 지지로 몇 년이 지난
지금, 초판 4쇄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린 초라한 별자리 그림 이야기에
비한다면 너무나 뜻밖의 성과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위치와 시간 속에서 생겨났다 소멸해 버린 무명의 수많은 소재들을 묶어 그림을
그리는 일은 환쟁이로서의 제 숙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찍이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은 없다
해도, 그것들을 낯설게 묶어 내고 스토리를 부여하려는 제 ‘별자리 명명식’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저를 이 땅에 초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보답이 될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