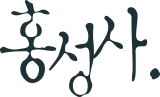쿰 350호
[저자의 일상] 정용섭 《설교란 무엇인가》, 《주기도란 무엇인가》 저자
–
늙어 가며…
–
올해 나는 지하철 무료 탑승 자격을 얻었다. 특정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기에 그런 일을 귀찮아하는 성격이라서 아직 손에 넣지는 못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노인으로 대우해 준다는 걸 보면 나도 나이가 충분히 들었다는 게 실감난다. 목사로 살다 보니 어느 사이에 늙어 버린 것이다. 늙는다는 건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할 순간이 다가온다는 뜻이다. 원하지 않아도 정리하지 않을 수 없다. 생명의 힘들이 시나브로 나에게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우선 일상에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생체의 쇠잔이다.
시력은 날이 갈수록 떨어진다. 오십 살 될 때까지는 안경을 쓰지 않고 지냈다. 오십 초반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다. 시력만이 문제가 아니다. 시신경이 노후되는 탓인지 책을 오래 보기 힘들어졌다. 어쩌다가 안경을 챙기지 못하고 외출했다가 작은 글씨를 봐야 할 경우에는 난처한 일이 벌어진다. 다른 한편으로 시력이 떨어지는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인다. 볼 것들을 충분히 봤으니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는 세상을 너무 세밀하게 보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것이니 말이다.
다른 사람은 늙어도 소화 능력이 여전하다고 하지만 나는 그 부분이 힘들다. 음식 맛이 있다거나 분위기가 좋다고 배불리 먹다가는 다음 날 틀림없이 위장에 문제가 생긴다. 위의 탄력이 줄어서 일정한 양 이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동안 젊은 시절 배불리 먹었으니 이제는 약간 적게 먹어도 크게 손해날 일은 없다. 여전히 세계의 기아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니 조금씩이나마 적게 먹는 것이 다행일지 모른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근육이 줄어드는 걸 여실히 느낄 수 있다. 힘을 쓰기 힘들다. 줄넘기를 하려면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이 탄력적으로 움직여 줘야 한다. 사과를 손으로 자르려면 손아귀의 근육이 받쳐 줘야 한다. 이런 일이 이제는 버겁다. 방 안에서 움직이다가 나도 모르게 벽이나 물건에 어깨를 살짝이라도 부딪치면 몸 전체가 충격을 받는다. 젊은 시절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것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다. 힘을 쓰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허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아닌가.
늙어서 치매에 걸릴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제법 된다. 오래된 일은 기억하지만 최근의 일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수준 이상으로 자주 벌어지면 치매를 의심해야 한다. 나도 언제부터인가 시간 감각이 흐릿해질 때가 종종 있다. 손톱을 하루 전에 깎았는지 일주일 전에 깎았는지 기억나지 않기도 한다. 아침에 빵을 굽고 커피를 내리고 과일을 깎으면서 순서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접시 용도가 헷갈리기도 한다. 일상 자체가 희미해지는 것이다. 이런 늙는 현상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다. 일상을 너무 예민하게 대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만큼 안식의 영역이 넓어졌다는 뜻이다.
생체능력은 떨어지지만 오히려 더 활기가 도는 일들이 내 일상에서 벌어진다는 게 신기하다. 늙으면서 성경의 세계가 더 환하게 들어온다. 젊은 시절에는 밋밋하게 보이던 구절들이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내가 평생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전업 목사로 살아서 그런가? 나름으로 신학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인문학 독서가 뒷받침된 것일까? 이유를 한 가지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늙어 가면서 성경의 세계가 더 가까이 보이고 느껴진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후 5:6)라는 말씀은 젊은 시절의 내 마음에 크게 와닿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는 저 구절이 가리키는 세계가 내 영혼에서 현실(reality)로 자리를 잡는다. 예수의 인격과 운명, 창조와 부활과 생명, 그리고 인간의 인식론적 토대가 저 구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눈에 들어온다. 그러니 늙음의 일상이 어찌 아니 즐거우랴. 주님을 향한 마지막 기도는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강해하다가 숨이 끊어졌으면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