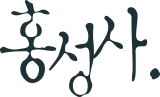시편, 신앙의 보고(寶庫)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 시편 23:1
부끄럽지만 어린 시절 시편을 오해했다. 시편을 그야말로 아름다운 시(詩), 낭만적인 시(詩) 가득한 시 모음집으로만 알았던 것이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생각만 해도 마음 편안해지는 목가적 풍경 안에서 노래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얼마나 낭만적이고 매력적인가. 대단한 착각이었다.
학부 시절 구독한 묵상집의 월요일 본문은 언제나 시편이었다. 가까이서 깊이 시편을 들여다볼 때면 종종 당황스러웠다. 아름답기는커녕 사고가 정지되는 순간이 더 많았다. ‘아니, 이렇게까지 날 것의 언어로 기도해도 된단 말인가?’ 힘들다고 울부짖고, 또다시 힘들다고 울부짖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반문하다가 타인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시편의 거친 언어들은 날 머뭇거리게 했다. 그러나 이 날 것의 시들이 내 신앙의 숨통을 터줬다. 하나님 앞에서 내 언어를 찾아 주었다.

어쩌면 시편과 우리 인생은 닮은 것도 같다. 멀리서 볼 땐 그런대로 보기 좋고 괜찮아 보이나 가까이서 보면 고통과 눈물, 원망과 인내가 얼룩덜룩하다는 점이 그렇다. 한 해 두 해 나이를 먹어가며 시편에 깊이 공감할수록 어쩐지 세상의 ‘마라 맛’을 알아가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지만 앞서 ‘마라 맛’ 세상을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의 날 것의 고백, 시편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조성욱 목사는 시편을 가리켜 ‘신앙의 선배들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극복한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인 보고’라고 말한다. 저자의 말처럼 시편은, 그리고 저마다의 시편 묵상은 오늘도 차곡차곡 믿음의 유산으로, 신앙의 보고로 쌓여 간다. 이 계절, 《조성욱의 시편 산책》을 길잡이 삼아 저마다의 시편을 아름답게 고백해보시기를.
글 |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