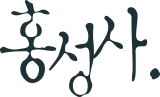쿰 373호
{살며 사랑하며} 문지희 쿰회원, 《유럽 가족 소풍》 저자
–
작지만
소중한 것에
관하여
–
한밤중에 나를 깨운 건 엄지발가락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엄지발가락에서 발꿈치
쪽으로 조금 내려온 지점에 튀어나와 있는 뼈 부분이었다. 찌릿찌릿한 통증이
10여 초 간격으로 계속되었는데, 다시 잠을 못 들 정도로 꽤나 아팠다. 어둠 속에서
발을 주무르며 아픔을 참다가,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약품통을 뒤져 파스 한 장을
붙이고 나서야 겨우 다시 잠들 수 있었다.
이삼 일이 지나도 계속된 증상에, 남편까지 대동하고 병원을 찾았다. 엑스레이 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의사가 물었다. “혹시 최근에 갑자기 격한 운동을 했어요?”
“글쎄요. 그렇게 심한 운동은 안 했는데, 며칠 전에 공원을 2시간 정도 걷긴 했어요.”
“음. 평소에 자주 운동을 하세요. 오늘은 물리치료 받으시고, 또 아프면 다시 오고요.”
“아, 네….”
운동 부족인 게으른 사람 취급을 받은 것 같아 기분이 묘하게 찝찝하고, 분명 고통은
존재하는데 원인은 알 수 없다니 답답하기만 했다. 하얀 커튼으로 가려진 좁은 침대에
누워 물리치료를 받으며, 나는 최근에 내가 발을 다칠 만한 상황이 있었나, 시간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아! 의사 선생님 앞에서는 왜 그 생각이 안
났지? 최근에 새로 시작한 일이 있는데, 혹시 그것 때문인가?
한 달여 전부터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터였다. 집 근처 유치원에서 매일 오전
3시간씩, 등원하는 아이들의 체온을 재고, 가구와 물건들에 소독약을 뿌려 닦는
코로나19 방역 일이다. 급히 사람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어차피 집에 있는 한가한
시간에 나가서 일하면 운동도 되고 여윳돈도 벌겠다 싶어 시작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 일이 내 건강에, 특히 발가락에 무리가 되는 것이었을까?
‘혹시나’ 했던 가설은 다음날 유치원에서 ‘역시나’ 사실로 판명되었다. 교실 곳곳에
놓여 있는 수십 개의 책상과 의자들을 눈여겨보니, 책상 높이는 내 무릎 언저리,
의자의 좌석 높이는 겨우 20센티미터 정도였다. 나는 이걸 닦으려고 매일 수십 번
쪼그려 앉는 자세를 취하며, 내 왼쪽 엄지발가락에 온 체중을 싣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니 아프지 않고 배기겠나! 60킬로그램도 넘는 무게를 저 홀로 떠받치던 작은
발가락이 참다 참다 못 참고, 그 밤중에 구조요청을 보냈던 거였다. 제발 자기 좀 살려
달라고, 나도 좀 기억해 달라고…….
여러 생각들이 스쳤다. 이런 일을 할 때에도 바른 자세와 지혜가 필요하구나!
어떤 일이든 무턱대고 달려들면 어디에서든 실수나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럴 땐,
이런 작은 신호들을 만날 땐, 잠시 멈추고 이유가 뭔지, 내가 무심히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오래 해낼 수 있는
비결일 것이다.
또한 겨우 세 시간, 별로 힘들지 않은 일일 거라 만만히 보고 시작했는데, 이 일도
쉬운 게 아님을 깨달았다. 아니, 내가 그동안 너무 편안하게 세상을 살았던 것이다.
이 정도 노동에도 내 몸은 이렇게 아우성치는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힘들게
육체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 몸의 통증과 흔적들을 가지고 계실지,
감히 짐작하기도 죄송스럽다. 이 사회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진실로 존경스럽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그분들이야말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세상을 떠받치고 계시는 분들이다.
나도 내 소중한 발가락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로 했다. 그들의 일방적 희생을 멈추고,
의자를 닦기 위해 쪼그려 앉을 때마다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붙였다. 저녁엔 따뜻한
물로 족욕도 하고, 크림도 듬뿍 발라 발마사지도 해주었다. 눈에 띄지 않는다고
무시해선 안 된다. 크기는 작고, 신발과 양말 속에 때론 웅크리고 있어도, 이 한
몸 다 버텨줄 정도로 강력하고, 아프면 내 온 잠 다 달아나게 할 정도로 영향력 큰
존재가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